한국시는 사기다
본문

대중가요 가수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부를 곡을 수백 번 연습한다고 한다. 아무리 자주 부르던 곡이라 해도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올라가야 실수를 덜하게 되고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겠고, 해서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이런 피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뜻을 이루는 일이 더 많지 않겠는가.
화가들은 작품 완성에 몇 달 또는 몇 년 걸리는 작품도 있다고 한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시인들은 시 한 편을 쓰는데 과연 얼마나 독한 정성을 기울일까가 궁금해진다. 혹시 시선詩仙이라는 이태백李太白의 천재적 일필휘지一筆揮之를 흉내라도 내듯 자신을 과신하고 오판하는 일은 없을까. 또한 시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읽어줄 독자들을 위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까. 혹시 자신만의 대단한 작품세계를 위해 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시인들은 없는 것일까. 원고청탁을 받으면 그제사 작품을 준비하는 시인들도 더러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시는 아무렇게나 언제든 쓸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닐는지 의아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인들은 역시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없는 천재들임이 분명하다.
정상에 오르면 오르는 순간 바로 내리막길을 타게 된다고 한다.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에도 떨어지자마자 자연스럽게 상승을 시작한다고 한다. 굳이 주역의 ‘변變’을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젊고 새로운 세대가 사라져가는 한국시의 하강은 정상에 올라서였을까. 정상에 올라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하강으로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던 것일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다’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제시기를 합하여 고작해야 근 백년에 지나지 않는다. 오백년을 그냥 씹어먹어버린 조상탓도 있겠지만 이것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시의 진정한 나이로 보여진다. 근대시와 현대시를 거론하면서 근대이전이나 고대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한국시, 도대체 어떤 경로로 탄생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신비롭고 전설스러운 탄생신화도 없어보이는 한국시, 그런 한국시에 내리막길에 선 전성기는 과연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아리송하고 참담해진다.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전성기가 올 수라도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도 생각하면 할수록 비관적인 기분에 빠져들게 된다.
한국시는 다 죽어간다고 안타까워들 한다. 도무지 젊은 사람들이 더이상 시단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 당연한 걱정이다. 노인들만 남아서 노인들끼리 쓰는 시,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시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노인들의 시가 대부분인 힘이 빠진 시단이 바로 노인정 한국시단이라는 불편한 추측이다. 물론 우리나라 밖의 시단도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것은 어쩌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세상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탓일 수도 있다.
먹고사는 방편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떨어지는 시를 이 시대 누가 감히 지키고 서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를 젊은 누구에게 권유하고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겠는가. 읽지도 않는 시를 남발하며 온갖 폼을 잡는 이상한 시인들도 있다고 한다. 시가 마치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대며 시인입네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시가 과연 무엇이길래. 시가 과연 무엇을 가져다 주길래,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 관념이나 엉뚱한 사유에 빠져 시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을까. 도대체 어쩌자고 보이지도 않는 정체에 붙잡혀 하릴없이 허둥대고 있을까. 한국시는 과연 무엇인가.
시가 가사상태로 빠져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자. 우리는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를 제대로 쓰고는 있는가. 시의 발전을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시인들이여, 도대체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도대체 어느 길로 나가려 하고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으니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날아가려 하는가. 방향을 모르니 손바닥 점으로 아무렇게나 길을 잡으려 하는가.
한국시가 오늘날 불쌍한 신세가 된 배경에 시인들이 책임져야 할 몫도 다분히 있지는 아니한가. 세상의 변화 탓만이 아니라 시인들이 게을렀거나 교만했거나 무지했던 탓은 없었을까. 어린시절부터 교과서에서 판에 박힌 시를 배운 탓에, 자라서도 일방통행으로 굳어버린 죽은 지식들에 묶여있지는 아니했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찾고 만들고 개척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지는 아니했을까.
시란 기본적으로 형식과 리듬이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은 물론 필자만(?)의 주장이다. 아무도 형식과 리듬에 눈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현란한 방식으로 더 독자들의 눈을 속일 것인지를 연구하고, 단순함과 재미스러움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더 심오한 사유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기를 쓴다. 기이한 방식으로 문자의 세계를 벗어나며 온갖 부호와 이미지를 총동원하여 길을 열어가려고 애를 쓴다.
마치 그것이 시의 새로운 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문학이 아니고 시가 아니지는 아니할까. 다만 미술의 사생아이고 사진의 사생아이고 수학의 사생아이지는 아니할까. 아예 애당초 시를 다양한 종합문화 비스무레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는 아니했을까.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지는 말자. 그 어떤 방식도 문제가 있다 하지는 말자. 그러나 그 사이 시는 자빠져 이제 혼자는 숨도 쉬기 힘들다. 국가가 도와주어야 비로소 힘을 차린다면 그것이 시이겠는가. 그것이 자존심 세고 당당하고 대단한 예술이겠는가. 한심한 지경이 되었다.
어디에도 답은 없으므로 시에 있어서도 한국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답이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어디에도 길다운 길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이제 길은 하나 시를 죽이자는 것이다. 한국시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자는 것이다. 정체도 없는 한국시, 얼굴도 없는 한국시, 손도 발도 머리도 가슴도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시, 시라는 이름부터 인정할 수 없는 한국시를 아예 죽여버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가. 시라는 이름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한줄시, 두줄시, 세줄시, 네줄시, 다행시, 다연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자하면 당연히 미친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를 시도하는 시인들도 여럿 있다. 또한 차라리 띄어쓰기이고 문장부호이고 다 무시하자하면(별 문제가 없다.) 당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자기 리듬에 문장만 제대로 된다면 무슨 문제이랴. 시에 형식과 리듬이 아예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운문이기는 틀려먹은 것이다. 운문이니 산문이니 가름하며 전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눈 빤히 뜨고 속고 있는가, 대중들이여. 속이고 있는가, 한국시여./계간 리토피아 95호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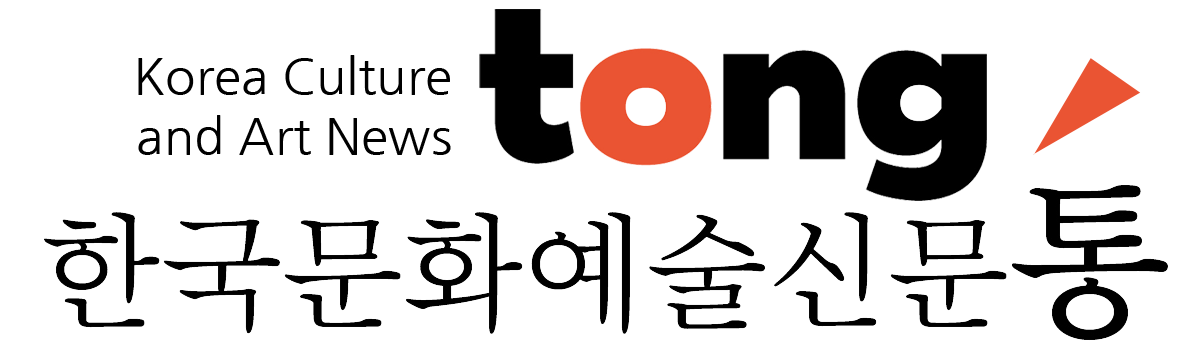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