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식 손바닥시 시집 '무심無心'
-2025년 1월 리토피아 발행, 14,000원/편집부
본문

강우식 시인이 2025년 새해 들어 새 시집 '무심無心'을 리토피아에서 펴냈다. 이 시집은 전체가 짧은 손바닥시로 이루어져 촌철살인의 시적 감성이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강우식 시인은 1941년 강원도 주문진에서 출생하여 196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사행시초'(1974), '사행시초·2'(2015), '마추픽추'(2014), '바이칼'(2019), '백야白夜'(2020), '시학교수'(2021), '죽마고우'(2022), '소이부답'(2023) 등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시학교수로 정년퇴임했다.
시인은 자서에 '무심 속에 유심이 있어 코스모스도 가을하늘빛이다. 가늘고 약한 몸으로 하늘을 닮으며 사는 마음이 가상嘉尙타. 비록 여리게 보이는 꽃이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크다. 내 시도 열심히, 열심히 코스모스를 닮았으면 한다. 마음껏 하늘하늘 춤추고 놀아라.' '손바닥 시다. 작고 우습게 여겨도 무심할 뿐이다.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세계가 있다 하지 않은가. 나는 일생 시의 유혹에 빠져 헤맸던 사람이다. 여자로 치면 보들레르가 일생 뿌리치지 못한 줄 것 다 주고 가질 것 다 벗겨간 쟌느 뒤발 같다.'고 적고 있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0여 편의 시를 묶었다. 그는 말미의 '여적'을 통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무심’히 살았다. 잠결 같다. 그래서 시집 제목도 ‘무심’이라 정했다. 좋은 말 좋은 제목도 많을 텐데 할 분도 있겠지만 내 첫 시집인 '사행시초'속 사행시 한 편에 쓴 시어를 마지막 시집이 될지도 모르는 데에 가져다 쓰기로 하였다. 이 시집은 강우식 사자성어 시집 '주마간산' 다음에 펴낸 책이다. 그리고 분단시 연작시집 『국경을 넘어서』를 세상에 선보이려고 한다. 분단국가에 살아온 시인으로 늘 마음의 부담이었던 우리의 탈북민들에 대한 시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사람을 이렇게 조급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떠랴.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지 않으랴. 나는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죽으면 묻힐 묘 자리와 입고 갈 상복의 삼베를 미리 준비해 여유를 가지고 사는 심정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늙어 되도록 나쁜 소리 귀에 안 담고 가려는 내 마음도 이와 같다. 무심한 인생살이 이만하면 잘 살다 간다. 시집에서 짧은시를 손바닥 시라 만들어 쓴 것도 내가 최초요 서문인 지은이로부터 1, 2를 시집 앞머리와 끝나는 전후 상관없이 다는 것도 내가 처음 하는 행위다. 나는 이런 것이 즐겁다. 정년 후 매년 한 권씩 낸 시집의 표지도 미숙하나마 내가 직접 구성하여 만들었다. 또 나만의 새롭게 할 일이 있었으면 한다.'고 손바닥시를 묶은 소회를 토로했다.
 강우식 시인
강우식 시인
가벼움
아내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로
입관할 때 몸을 들어보았다.
평소에 안아보던 아내의 몸이 아니었다.
종잇장처럼 가벼웠다.
이승을 떠나려고 몸속뿐 아니라
몸 밖 인연들마저 다 버린 것 같았다.
다른 세상 다시 못 올 길을 가니까
가볍게 떠나긴 하여야겠지.
고승들아 신자들에게
무소유를 법인 양 내세우지 마라.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가벼워진다.
팔십 늙은이인 나도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는 죽음을 느낀다.
변기 물에 가라앉던 똥도 가볍게 뜬다.
가시나무새·1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에
자주 앉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생 가시나무새를 본 적이 없다.
당연히 무슨 새인지도 모른다.
제 아무리 빈틈없이 가시가 박인
가시나무라 하더라도 빈자리는 있다.
신기하게도 새는 고 자리만 가시가 없는 줄
어찌 알고 경계도 없이 앉는다.
앉은 자리가 풍수지리가의
뺨을 칠 정도로 명당 중에 명당이다.
하필 새는 가시투성이인 나무에 왜 앉아 있을까.
가시나무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가시로 무장했는데
그 가시가 생각 밖의 좋은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용케도 새는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위험한 데가 그중 안전한 데임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알고 찾아와 친구가 됐다.
가시나무새·2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의 가시를 믿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산다.
가을비
비를 맞으며 가진 거 다 떨궈도
낙엽송들이 뼈가 마디면
겨울을 견디듯이
사람도 뼈마디가 버티는 마지막 힘이다.
무너지면 다 허물어지고 만다.
가을비에 젖고 추위에 꺾이면서도
삶을 견디는 나무인간.
견뎌라. 석 달 열흘은 금방 지난다.
가자미·1
참 ‘가’ 씨라는 희성을 지닌
자미 있는 어족이다.
늘 수평적 사고가 넘치도록
사람으로 치면 배를 땅에 붙이고
바다너울을 따라 사는 것 같다.
수직적 사고인 다른 생선보다 여유가 있다.
생김새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강원도 바다 아낙네처럼 손이 크고 넓적하다.
가자미 식혜를 담근 집에 들러서는
밥 한술이라도 넉넉히 얻어먹을 거 같다.
그래서 그런지 가자미눈을 뜨고 사는
아내와 평지풍파로 옥신각신 다툰 날에는
우리 내외는 밥상머리에 앉아
무채를 썰어 넣고 버무린
달콤새콤한 가자미 식혜를 먹으며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내가 네가 서로 닦아주랴 하다가
시무룩했던 입도 배시시 열린다.
가자미·2
한 세상 속 좁게 부대끼며 아득바득
살 필요 뭐 있노.
넓디넓은 세상 평수에 맞게
편하게 살아야지.
바다를 닮은 광어다.
광어에 비해 잔챙이인
가자미도 그렇게 산다고 흉내 내지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지천이면
똥값에 천대받는다.
내 고향 주문진에서는 사철
가자미를 흔하게 보지만
회로 먹을 때는 모두들 군말이 없다.
광어와 달리 뼈째로 회 뜬 가자미는
그것대로 십는 맛이 별미이기 때문이다.
가자미·3
한 번 기를 펴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별별 곳에서 압력이 들어와
납작 엎드리고 살 수밖에 없었나.
걸음걸이도 너덜너덜 너풀너풀하다.
곧고 힘차지 못하고 흐느적댄다.
그러고도 사시 눈 뜨고
일 년 열두 달 눈치를 봐야 사는 팔자다.
사람들은 내 처세가 다 가짜라고
‘가’ 씨 성을 달고 재미있다고 가자미라 부른다.
정말 다 가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갈매기
갈매기는
해종일 무위도식無爲徒食처럼
그저 바다를 오가지 않는다.
바다가 생활의 일터다.
짠물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해만 뜨면 바다라는
넓고 큰 평야에 나가
물결이랑을 부지런히
갈고 매기도 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산다.
그래서 이름도
갈매기로 지었나 보다.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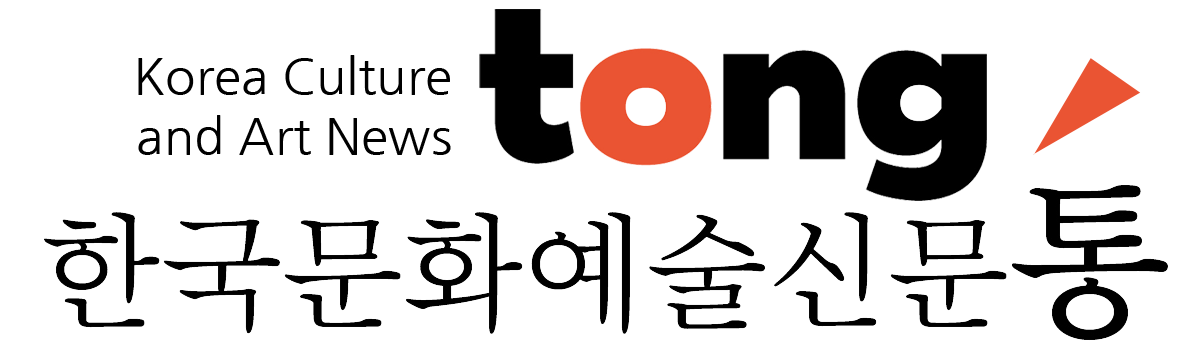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2
방서현님의 댓글
이현성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