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성복
본문

그는 돌 속에서 눈을 뜬다 사방은 고요하고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시계를 본다 그는 작은 소리로 묻는다 “이젠 지나갔겠지?” 아직, 아직…… 이라고 시계가 재잘거린다 그렇다면 더 자야 한다는 건가? 그는 배가 고프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 흔들리는 컵 속의 물처럼 그는 움칠거린다, 갑자기 구둣발 같은 것이 그의 목을 밟아 누른다 그는 소리를 질러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윽고 그는 비틀어진 닭 모가지처럼 축 늘어진다 커다란 손 하나가 들어와, 침 흘리는 그의 머리맡에 깎은 배와 사과와 가래떡을 놓는다 그의 이마에 고여 있던 땀방울이 조금씩 굴러내린다 “병신 하나 줄었군……” 나란히 서서 그들은 오줌을 누고 몸을 부르르 떤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이성복(1952- )
1977년 시 「정든 유곽에서」를 ≪문학과 지성≫에 발표하며 등단. 시집으로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남해금산』 『그 여름의 끝』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아, 입이 없는 것들』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뉘 자국』 『래여애반다라』 『어둠 속의 시; 1976-1985』, 산문집으로 『꽃핀 나무들의 괴로움』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했는가』 『오름 오르다』 『타오르는 물』 『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고백의 형식들』, 대담집으로 『끝나지 않는 대화; 시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문다』. 시론집으로 『무한화서』 『불화하는 말들』 『극지의 시』 등
이 시는 시인이 기발간한 시집에 미수록한 시들을 연도별로 분류해서 편집한 시집(『어둠 속의 시: 1976-1985』)속에서 1980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시 속의 화자의 모습이 낯설지요. 요즘 젊은 세대라면 되려 더 낯설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배경으로 깔고 있는 장면과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대부분 웹 소설과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주인공들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종횡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의 모습에서 종횡무진을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종횡무진은커녕 거의 정중동입니다.
임사체험은 말 그대로 체험이어서 혼이 잠깐 나갔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에서의 화자에게서는 되돌아오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장면을 세 번 바꾸며 전개되는 이 시를 저는 비유가 아닌 ‘실제 정황’으로 읽습니다. 초현실이 아닌 정황입니다. 제게 있어 “돌 속에서 눈을” 뜬, “오늘”이 “생일”인 “그”는, “아직”까지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적 상상은 현실을 떠나 있는 듯 보이지만 시도 정황도 여전하게 현실에 묶인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유합니다. 悠悠하고 唯唯하며 儒儒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내일은 또 어떨런지요./남태식(시인)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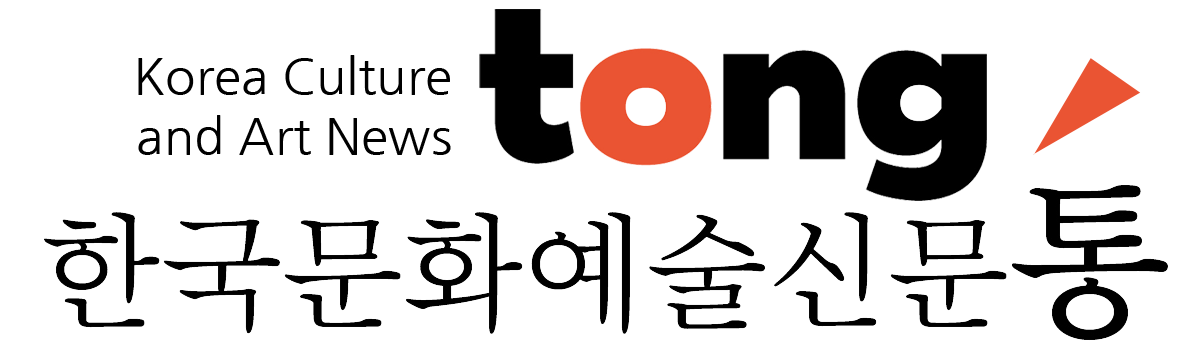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