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축제/임채성
본문

내 몸이 천 개라면
네 허기가 채워질까
꽃과 잎, 단풍 같은 눈요기론 모자라서
등골에 빨대를 꽂고
휘파람을 부는 이여
네 봄이 축제라면
내 봄은 천형인가
포식과 피식 사이 빈혈증이 도지는 숲
서둘러 흡혈을 끝낸
봄이 성큼 저문다
- 계간 ≪리토피아≫ 2025년 봄호
200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 시조집 『메깨라』 외, 정음시조문학상 수상 외.
겨울 가뭄을 해소하여 농사에 이로운 눈이라 봄눈을 서설瑞雪이라고도 합니다. 이 봄눈은 긴 가뭄을 함께 겪는 산천의 나무와 풀에게도 서설이겠습니다만, “빈혈증이 도지는 숲”을 응시하고 있는 시인에게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빨대는 물이나 음료를 빨아올려 마시는 데 쓰는 길고 가는 대롱입니다. 요즘엔 환경 문제의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는 이 빨대는 본래의 뜻을 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약한 상대에게서 지속적으로나 고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반대로 강한 상대에게 빌붙어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비꼬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빨대를 꽂”다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어떤 기관, 집단이 가진 이권이나 이익을 빨대로 빨아먹듯 뽑아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꽃과 잎, 단풍 같은 눈요기론 모자라서//등골에 빨대를 꽂고/휘파람을 부는 이”는 약한 상대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이에 속하겠습니다. 음식이나 재물 따위를 먹거나 가지려고 무척 욕심을 부리는 데가 있다는 뜻을 가진 말로 게걸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이 천 개라면/네 허기가 채워질까” 이 허기를 과연 허기라고 부를 수는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허기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허기로 만들어서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자본의 생리라면 우리는 너무나 자본에 충실한 하수인이 되는 셈입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링거줄이 애써 목숨을 연장해서 자본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줄로 바뀌기도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면 마냥 씁쓸합니다./남태식(시인)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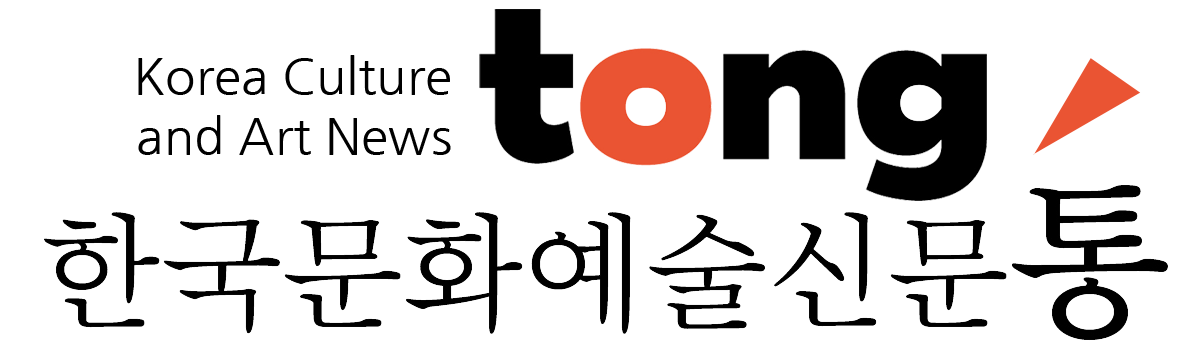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