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시인의 뼈아픈 질문과 성찰적 대안
시집 '어머니의 흑백사진'을 중심으로/글 : 백인덕(시인)
본문

김동호 시인/김동호 197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시산일기』, 『노자의 산』, 『나의 뮤즈에게』 등.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성균문학상, 군포문학상 수상.

필자/백인덕 시인 199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짐작의 우주』, 『북극권의 어두운 밤』. 수필집 『나는 숨쉰다, 희망한다』. 김구용시문학상 수상.
1.
어떤 질문의 무게는 무엇을 묻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묻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21세기 고도의 기술 문명을 구가謳歌하는 한국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비극의 주인공이고 연출자이다. “자기는 자기의 사형집행인이고 또 동시에 사형수다”라는 보들레르의 진단이 떠오른다. 한 세기 반이라는 시간과 유럽 대륙의 중심부라는 공간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인 왕국의 주재자인 시인이라는 자의식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 해야 하는 시민의 자질이라는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행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한다는 데서 뼈아픈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 가령 ‘좋은 시’를 정의하기 위해 동원하는 근거들, 교과서에 수록되거나 대학입시에 출제되었다거나 방송에서 다뤄졌다거나 시집이 많이 판매되었다 등은 그 자체로 해당 작품들이 ‘좋은 시’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면한 비극은 질문을 올바르게 제기하려고 노력할수록 그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심화한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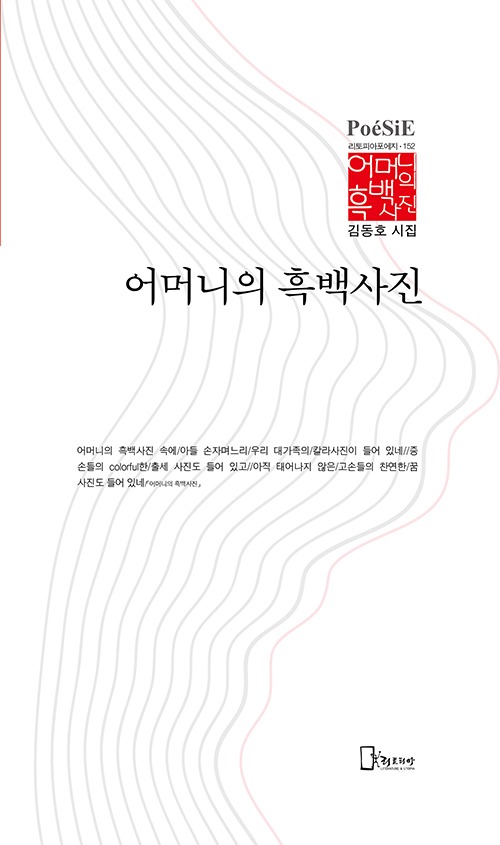
김동호 시인의 열일곱 번째 시집, 『어머니의 흑백사진』은 생명 일체一體에 대한 적절한 헌사를 쓰는 마음 바탕에 노시인이 평생 품어왔던 근원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얹는다. 또한, 명료한 해법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역逆으로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잘 사는 것일까’/평생 나를 따라다니는/이 물음이 오늘 아침/산책길에서도 나를 잡고/놓지 않는다.”(「시인의 말」) 밝힌다. 앞의 고백은 아마 이번 시집을 묶게 된 동기, 아니 시인의 시작詩作을 관통하는 내적 동기의 술회일 것이다. 이어지는 ‘시詩가 클까/부동산不動産이 클까’라는 마지막 연은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된 시인의 대답과 다르지 않다. ‘시’와 ‘부동산’을 단순히 ‘정신/물질’의 대비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어떤 사태를 형성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는 자세와 의미와 가치 등은 백안시하고 오직 결과를 과시하려는 자세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진의眞意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육식肉食동물들은
육肉을 날로 먹지 않아요
사랑과 감사로 숙성시켜
뼛속의 고열로 맛있게 익혀
그들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 담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잡아먹지 마라’
호랑이의 소리가 들리네요
‘고마움 모르고 먹으면
이빨 다 나간다’
독수리의 소리도 들리네요”
맨머리 동자승 B의 소리
(중략)
“인仁이 인人을 세운다
천둥 번개 벼락 관계없이
해 달 별과 함께
두 기둥 맞대어
인仁이 인人을 세운다
천체망원경과 전자현미경이
유전과 진화進化의 맥을
짚으며 짚으며”
맨머리 동자승 I의 소리
(중략)
우리의 원리
‘우宇’ ‘리利’의 원리이다
해와 달의 원리이고
밀물 썰물, 정맥 동맥의
원리이고 홀로와
더불어의 원리이다
고추장 된장, 수박 호박
살구 복숭아의 원리이다
맨머리 동자승 K의 소리
ᅳ「21세기 맨머리 동자승들」 부분
시인은 시의성이 농후한 여러 현상을 예시하면서 자신의 논거로 삼는 일반적인 발화법을 따르지 않는다. 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에둘러 표현을 극대화하는 것은 시인의 생리生理가 아니다. 또한, “직접경험보다/간접경험에서/더 많은 것을 배워요/허구虛構에서/더 많은 것을 보고/허공虛空에서/더 많은 원소를 마시듯”에서 드러나듯 시인의 실제 체험의 귀결이기도 하다.
인용한 작품의 발화 주체는 ‘21세기 맨머리 동자승들’이다. 그들은 “고찰高札 고승高僧”이 아니기에 아직 ‘소리’에 머물러 있지 ‘고담高談’의 경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높을 高’가 ‘옛 古’와 같은 ‘소리’란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고담은 아무리 경지가 드높아도 옛것인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치열한 방법이 없다면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오늘의 명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자승’의 발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맨머리’가 주는 푸릇함만큼이나 신선하고, 활기찬 것으로 느껴진다. 이 작품은 “고찰高札 고승高僧의 고담高談보다도/21세기 동자승들의/맨머리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시작의 동기를 밝힌 1연을 포함하여 ‘동자승 A’부터 시작해서 ‘동자승 L’까지 13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상의 특징은 연과 연 사이에 특수 문자 ‘*’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시는 물론 연구분을 통해 시상詩想의 전개를 도모한다. 이때 시상은 순치이기도 하고 도치되기도 하며 중첩하거나 반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연은 등가로 병치될 뿐 그 외의 작용을 멈춘다. 즉 시의 모든 내용, ‘동자승들’의 소리는 대등하고 같은 위상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 내용, 즉 ‘맨머리 동자승들의 소리’는 ‘섭생’에서 ‘죽음’에 이르고, ‘인간관계에서 우주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또한, 그것은 이번 시집에서 시인이 짧지만 명쾌하게 대답하는 모든 질문 내역內譯을 두루 포함한다. 그중에서, ‘동자승 K의 소리’는 앞서 시인이 ‘시인의 말’에서 던진 질문, ‘시가 클까, 부동산이 클까’의 변할 수 없는 원리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원리/‘우宇’ ‘리利’의 원리이다” 그것은 또한 ‘홀로와/더불어’의 원리이다 서로를 이롭게 하고, 그것이 “인仁이 인人을 세운다”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도의 기술 문명을 구가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한 비극의 경연장이 되고 말 것이다.

2.
김동호 시인은 필자의 어림짐작으로 ‘구부능선’을 향한 막바지에 도달해 있다. 이번 시집이 열일곱 번째라는 것도 시인의 인생과 시가 어떤 경지에 닿아 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시집의 표제가 ‘어머니의 흑백사진’이다. 눈 크게 뜨고 표제 시를 읽거나 시집 곳곳에 배어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표제의 의미를 쉽게 찾아낼 수 없다.
어머니의 흑백사진 속에
아들 손자 며느리
우리 대가족의
칼라사진이 들어 있네
증손들의 colorful한
출세 사진도 들어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고손들의 찬연한
꿈 사진도 들어있네
―「어머니의 흑백사진」 전문
시는 철학이 아니어서 ‘어머니’를 ‘원형 상징’의 틀에서 들여다보려는 강한 관성을 갖는다. 여기에 ‘흑백’이 과거를 표상하고, ‘칼라’가 현재를, ‘colorful’이 미래의 표상이라는 이해가 덧붙여져 한 편의 시를 이해하는 모형이 완성된다. 즉, ‘어머니’는 나의 귀환이나 귀소歸巢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역사의 기원으로 작동한다. 시인은 “풀밭 너머엔 연륜을 알 수 없는/큰 뽕밭이 있고 그 옆에는 누에들이/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흙담집이 있다/그 흙담집을 어머니가 정성으로 돌보고/계시다. 태초의 향가鄕歌를 불으시며”(「모천母川」)라는 이상향을 그린다. 회상이 아니라 예상한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회귀하는 ‘연어’를 따라갔을 때 닿을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시각적으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이다. ‘어머니’―‘아들(시적 화자), 며느리’―‘손자’―‘증손’―‘(“아직 태어나지 않은”)고손’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다 담겨 있다. 이는 분명하게 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역사의 기원이라는 점을 단박에 드러낸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적 화자에게 더 크고 심원한 의미를 준다.
모국어의 소리!
엄마 배속에서도 나,
모유母乳 같은 모국어母國語
들으며 자랐다
그 소리, 살 속
뼛속 깊이 배여
자궁 밖에 나와서는
시詩가 되고 있는 것 같다
ᅳ「모국어母國語, 모유母乳」 부분
주지의 사실이지만, ‘모국어母國語’는 ‘어머니와 같은 언어’라는 불가피성과 환원 불가능성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사용한 언어’라는 직접적인 의미도 갖는다. 시인은 모국어를 ‘엄마 배속’에서는 엄마의 심장 박동 같은 ‘소리’로 각인한다. 이어 ‘자궁 밖에 나와서는’ 양육養育의 기간에는 ‘모유’로, 이후에는 ”살 속/뼛속 깊이 배여“있는 생명의 ‘기氣’로 여긴다. 따라서 그의 ‘시詩’는 엄마의 소리와 젖과 엄마가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기가 외화外化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인은 거침없이 활달하게 ‘시’를 누리고 퍼트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3.
이번 시집은 5부 70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의 제작 연도보다 각 부의 주제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몸살 앓은 우리 사회의 세태 상도 외면하지 않았고, 연륜이라는 시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도 잘 살피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애틋함도 그대로 담겨 있다. 또한, 곳곳에 학문과 시작으로 일관해 온 시인의 인생에서 체득體得한 지혜의 요체要諦도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먼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느냐보다/어떻게 내려가야 하느냐가/더 절실해지는 9부 능선”(「9부 능선에서」)의 소회를 숨기지 않는다. 나아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풀라톤—마지막 길 잘 간 것/사실은 석양夕陽의 비수匕首 덕이다”이라는 시인으로서의 낭만적인 상상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그 사람 다 같다. 인人이다”(「옹翁과 염소」)라는 큰 깨달음의 말씀에 “염소수염을 한/옹翁이 이렇게 말하자/옆에 있던 염소가/맹ᅳ 하고 운다”는 우화를 덧붙이기도 한다. 시인은 진지하고 사뭇 엄숙한 질문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적합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혹은 가장 일반적인 예를 통해 보여준다.
“식사 뒤엔 바로
눕지 마시고
2, 3분 걸으셔여야 해요”
의사의 이 말 옳다
그러나 보태야할 말이 있다
부사 하나쯤 있어야 한다
가령, “식사 뒤엔 2, 3분
즐겁게 걸으셔야 해요”
‘즐겁게’란 부사 한마디가
뒤따르는 동사의 진동眞動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른다
ᅳ「부사副詞의 역동力動」 전문
김동호 시인은 의사의 권고를 “이 말이 옳다”라고 긍정한다. 전문가니까 과학적이니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순리이고 순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인생이라는 경험의 장場, 물론 여기서 시작詩作은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비춰 “부사 하나쯤 있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권고를 제시한다. 그래서 권고안은 “식사 뒤엔 2, 3분/즐겁게 걸으셔야 해요”로 바뀐다. 마지막 연 시인의 주해처럼 “‘즐겁게’란 부사 한마디가/뒤따르는 동사의 진동眞動을” 확장한다. 물론 그 확장은 ‘자연의 친자親子’가 되거나 그들에게 이어져 함께 진동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시집은 어수선하고 암울한 시대에 큰 울림 판이 될 것이다.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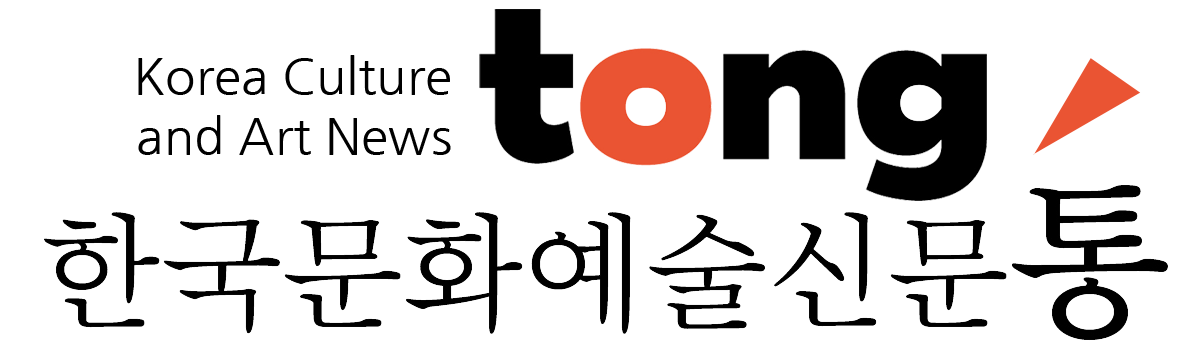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