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보물섬)을 지키는 파수꾼 박정규 시인
본문
글:장종권/발횅인

박정규 시인은 경남 남해군(보물섬)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고향을 지키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향마을을 가꾸는 사람이다. 리토피아는 오래전부터 이미 두 번이나 남해를 방문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이어리 체험마을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싱그러운 청보리밭이 소득 위주의 마늘밭으로 변해가는 시접이었으나 수려한 풍광은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남해의 자랑이었다.
그는 리토피아로 등단하여 리토피아문학상을 수상했고, 시집도 세 권(2003년 『탈춤 추는 사람들』, 2008년 『검은 땅을 꿈꾸다』, 2019년 『내 고향 남해』)이나 낸 바 있는 이른바 원년 리토피아 가족이다. 그는 고향마을 이어리의 체험마을을 관리하며 고향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편집부에 보내온 그의 글에는 자기소개는 없고 고향마을 소개뿐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남해도는 제주도(1,847㎢), 거제도(402㎢), 진도(363㎢), 강화도(302.4㎢), (남해도301㎢)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큰 섬이다. 남해군은 창선교(440m)로 연결된 남해도와 창선도(56㎢)를 합쳐 나비 모양의 보물섬 남해군(357㎢)이 되었다. 그의 고향에 대한 자랑거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석방렴과 희귀조류들을 먼저 꺼내들었다.

첫번째 석방렴은 고장 지역말로는 발장, 개막이, 돌발, 독살, 석전, 석제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이름이 참 많기도 하다. 돌로 만들었다하여 돌 석石자 석방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시설이다. 지역에 많은 돌을 이용하여 하루 두 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단다.
고기들의 물목을 돌로 막아 밀물 때 들어온 숭어나 멸치, 전어 농어, 망상어나 각종 잡어들이 물이 빠진 뒤 돌담 안에 고립되면 뜰채나 통발 또는 맨손으로 잡는 시설이다. 이곳 지형의 특성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깃든 어로방법일 것이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도 그 흔적들이 있다고 한다. 남해에서는 홍현 해라우지마을 석방렴이 유명하다고 한다. 200여년 전부터 해왔다고 전해지는데, 두곡, 원천, 용소 등 몇 군데 석방렴이 있었지만,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거의 멸실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에도 옛날 구 발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두번째는 이어리 체험마을에 찾아오는 희귀조류들이다. 검은머리물때새(천연기념물326호)는 텃새로 몸길이 약 45㎝ 먹이는 조개류와 연체류로 출현기는 연중이다. 서남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종으로 여기서 46마리가 관찰되며 설천 앞 무인도에서 번식한다고 한다.
두번째는 이어리 체험마을에 찾아오는 희귀조류들이다. 검은머리물때새(천연기념물326호)는 텃새로 몸길이 약 45㎝ 먹이는 조개류와 연체류로 출현기는 연중이다. 서남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종으로 여기서 46마리가 관찰되며 설천 앞 무인도에서 번식한다고 한다.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는 겨울철새이다. 몸길이 약 140㎝. 출현기는 10월부터∼이듬해 3월까지이다. 고니 종류 중 겨울에 가장 많아 찾아오는 종이다. 강진만에 10개체, 동대만에 15개체, 둔촌해안에 10개체가 머무른다.
팔색조(천년기념물 20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는 여름철새이다. 몸길이는 약 18㎝로 출현기는 5월부터 9월이다. 전세계적으로 700∼2,500여 마리뿐인 조류이다. 남해 여러 곳에서 번식한다.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 야생생물2급)도 있다. 몸길이 약 61㎝로 먹이는 곤충류, 게류, 조개류, 연체동물이다. 도요 종류 중 가장 큰 종이며 이동 중 이곳 앞바다에서 며칠간 먹이 활동을 하다가 떠난다고 한다. 그 외 갈매기, 백로, 왜가리, 도요새가 있다는데, 도요류는 좀도요, 민물도요(쫑찡이),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철새들이라고 한다.

그는 이어리 체험마을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소개했다. 조개류로는 바지락(반지락, 소합, 황합, 업조개)이 대표적이다. 바지락은 바지락죽, 바지락숙회를 해먹는다고 한다.
또한 조개탕, 조개젓을 해먹는 동죽(불통, 모래조개)은 지표면에서 10㎝의 비교적 얕은 위치에서 서식한다는데, 크기는 3∼4㎝ 정도로 껍질이 통통한 편이다. 또 입술부분은 연한 베이지색을 띠며 윗부분은 개흙색을 띠는 특성이 있단다. 동죽은 입수관으로 해수를 취하고 해수와 함께 들어온 먹이를 아가미의 점액으로 감싼 뒤 입 주위에 있는 순판을 움직여 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조간대의 뻘지역에 서식하는 가무락(모시조개, 까막조개, 새만금에서는 ‘날추’라고도 부른다. 진도에서는 ‘대롱’, ‘나박’이라 부른다)은 동죽에 비해 납작하나 크기는 조금 더 크단다. 색깔은 보통 검은색이며 두꺼운 조가비의 표면은 성장의 흔적으로 보이는 가는 선이 전체적으로 나 있다는데, 백합과의 조개로 우리나라 남서해안 뻘지역에서 서식한다. 남해안 가무락은 서해안 가무락과 차이가 있다. 각폭(두께)이 서해 가무락보다 두껍고 각정(뽀족한 부분)이 더 뽀족하며, 둥근 부분(서해 가무락은 흰색임)이 보라색이나 분홍색을 띤다고 한다.
떡조개(납작조개, 나박조개, 마당조개)는 백합과의 조개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한다. 타지역에서는 식용하나 충남 삽시도에서는 속살이 적다는 이유로 식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럭조개(띠조개), 피조개, 새꼬막, 새조개, 갱조개(개량조개, 노랑조개), 민들조개(동해안의 모래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이나, 서해. 남해 모래지역에서도 서식한다)도 서식한단다.
 어류로는 전어, 숭어, 밀찡이, 망둥어가 대표적이고, 연체류로는 쏙(갯가재와 북한어로 바다가재와는 다르다. 갯가재의 사촌격임), 낙지, 문어, 주꾸미(일명: 모래문어)가 있는데, 갯가재는 몸길이가 15㎝까지 성장하며 서남해안의 모래펄 바닥에 구멍을 내고 산단다. 갯지렁이나 어류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 생물이란다. 식용할 때 양쪽에 가시부분을 잘라내면 등껍질도 저절로 떨어져 먹기가 좋단다.
어류로는 전어, 숭어, 밀찡이, 망둥어가 대표적이고, 연체류로는 쏙(갯가재와 북한어로 바다가재와는 다르다. 갯가재의 사촌격임), 낙지, 문어, 주꾸미(일명: 모래문어)가 있는데, 갯가재는 몸길이가 15㎝까지 성장하며 서남해안의 모래펄 바닥에 구멍을 내고 산단다. 갯지렁이나 어류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 생물이란다. 식용할 때 양쪽에 가시부분을 잘라내면 등껍질도 저절로 떨어져 먹기가 좋단다.
게류로는 (민)꽃게(경기 충청권에서는 박하지게, 전라권에서는 뻘떡게, 독게), 칠게, 엽낭게(콩게), 납작게(돌쨍이), 갯게, 방게, 도둑게가 있으며, 고동류로는 갯고동, 댕가리, 대수리, 맵사리 등 부착성 생물(따개비, 담치, 홍합)이 있다고 한다.
박정규 시인의 대표시 「내 고향 남해」이다.
할머니 얼굴 주름살 골을 타고 달려온 버스가
마중 나온 산모퉁이를 돌아서니
싸-한 바다냄새 비늘처럼 일어나 차창을 두드린다
산허리까지 올라선 다랑이들 가슴에
노니는 물안개가 도솔천 대문을 지키고 있다
파릇파릇 마늘 농심 꿈으로 키우는 동면 잊은 다랑이들
대장군 여장군 우뚝 섰는 남해대교 두 팔 뻗어 반기고
방파제 깨우는 파도 거품 위를 비상하는 갈매기들
통통 고깃배 넘나드는 해전포구 노량바다 거북섬 지킴이
세속에 발 담지 않은 처녀 허벅살처럼
뽀송뽀송 싱싱한 횟집 아줌니
골뚜기 병어회에 묻어나는 인심
망운산 골짝 깬 청옥 같은 물줄기
뿌리 이어 내려오는 맑디맑은 내 고향
할아버지<할아버지<할아버지께서
토담 치고 옹기 모아 둥지 튼 보금자리
할머니 쌈지 속에 콧물 묻은 지폐처럼
밟아버린 세월 저편 아련한 추억들
삶의 주머니에 꼬깃꼬깃 숨었다가
겁 없는 망아지처럼 버스 안을 뛰어든다
버스는 꼬불꼬불 시간 속을 달리건만
차창 밖 어린 세월은 새치만큼씩 마음 안을 키운다
아, 언제나 안기고픈 비릿한 흙냄새 마늘향기
토끼반도 남쪽 바다 한려공원 중심에서
청정해역 출렁이는 내 고향 남해.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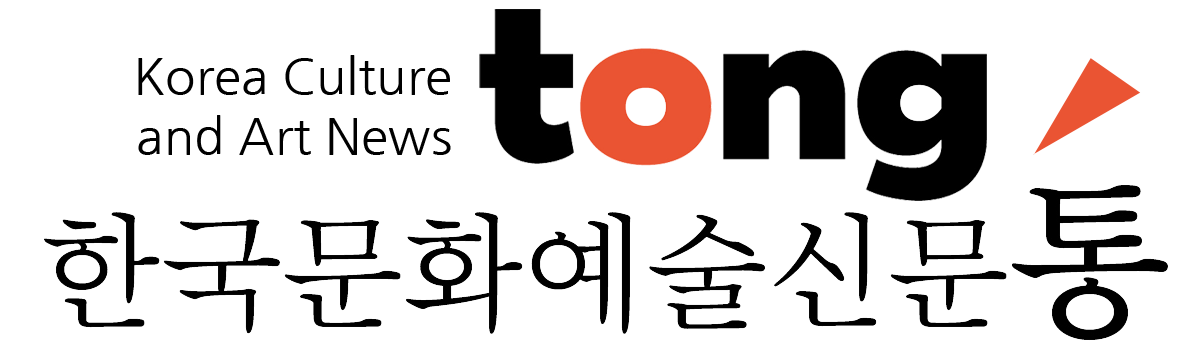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