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선群山線’, 도깨비처럼 사라진
안성덕의 길·5
본문

개통 당시 군산역(군산시 대명동 138-3)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는 1900년 7월 서울-인천 간 ‘경인선’ 개통이 그 시작이다. 곳곳에 철로와 역이 생겼다. 노선 쟁탈전도 치열했으나, 일부 지역은 유림儒林들이 주동이 되어 철도부설을 극구 반대했다. 전주가 대표적인 예다. 공주-논산-전주-송정리-목포로 계획했던 호남선이 우여곡절 끝에 대전-이리-정읍-송정리-목포로 정해졌다. 그러자 일제강점기 군산 거주 일본인들이 호남평야의 양곡 수탈을 목적으로 군산과 이리를 잇는 ‘군산선’을 요구 개통케 했으니, 1912년 3월 6일이었다.
-군산역(군산시 대명동 138-3)

군산선, 군산-개정-대야(지경)-임피-오산리-익산(이리) 구간 24.7km다. 군산역은 시발점이자 종착지였다. 정원 150명, 객차 3량짜리 꼬마열차인 통근열차를 운행했었다. 하루 편도 8번, 왕복 16회 전라선 구간인 전주까지 운행했으나, 2007년 12월 31일 승객감소와 철도노선 변경으로 운행이 종료되었다. 학생과 직장인과 인근 주민이 주요 고객이었다. 손수 가꾼 농산물을 새벽 첫 통근열차로 싣고 와 거래했던 군산역 광장의 ‘도깨비시장’은 지금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군산화물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항선의 신 군산역은 내흥동에 있다. 장항선이 금강을 건너와 대야역을 거쳐 익산까지 이어지고, 군산선과 군산화물역은 2022년 3월 6일 110년 만에 폐지되었다.

-대야역(구 지경역,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25)
군산역을 출발한 열차가 개정역을 지나 두 번째 정차했다. 2020년 12월 10일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27 장항선 신 대야역으로 이전되었다. 이름표도 떼어내 버린 역사驛舍 뒤로 녹슨 철길이 꾹 입을 봉하고 있다. 왁자했던 시절의 내력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듯, 할 말이 많다는 듯 늙은 은행나무가 삐쭉 삐죽 참새 주둥이 같은 새잎을 틔워내고 있다. 일제가 양곡을 수탈할 목적으로 1912년 3월 6일 길을 열었다. 1953년 ‘지경역’에서 대야역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8년 1월 1일 장항선으로 편입되었다.
-임피역(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26-1)
 현 임피역
현 임피역
대야역과 오산리역 사이 간이역이었다. 시속 60km로 서고 달리기를 반복하던 열차, 느릿느릿 바쁠 것 하나 없다는 듯 전라도 말로 싸드락싸드락 깐닥깐닥 달렸을 터다. 2008년 1월 1일부터 통근열차가 없어지고 장항선 새마을호가 정차해 한국철도 역사상 최초로 새마을호가 정차하는 무인역이었으나, 수요가 없어 같은 해 5월 1일 여객 취급이 중지되었다. 1912년 개통되어 95년간 열렸던 길이 지워졌다. 역사驛舍는 원형이 잘 보존된 1930년대 건축물이다. 당시 간이역 전통적 건축양식이었다는 ‘르네상스 양식 바탕 전통주의적 양식’이며 등록 문화재 제280호다.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있다. 역내에 재현된 매표소, 박제된 시간표가 오지 않을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1960, 70년대 흑백영화 세트장 같은 구내가 쓸쓸하고 반갑다.

-이리역(익산역, 익산시 창인동 2가 1)
호남선 노선이 변경되며 생겼다. 익산군益山郡 남일면南一面 이리裡里였으며, ‘속리’ 또는 ‘솜리’라 불렸던 한촌이었다.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개통으로 일약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호남선 강경-이리 간, 군산선 군산-이리 간 개통으로 1912년 3월 6일 영업을 시작했다. 이름 없던 이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호남선, 전주는 반대하고 군산은 주장하니 그 중간지점인 이리가 어부지리 한 셈이다. 역사驛舍는 1977년 11월 11일 폭발 사고 후 1978년 신축되었으며, 1995년 ‘익산역’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2014년 11월 29일 현 선상 역사로 옮겼으며, 2015년 호남선 고속열차가 개통되었다. 이리역 아니 익산역은 호남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열차의 필수 정차지며 연장된 장항선의 시·종착지다.
 현 익산역
현 익산역
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든다. 사람이 사라지면 길도 지워진다. 가는세월에 길도 닳는다. 24.7km 군산선, 1912년 3월 6일에 첫걸음 떼어 2008년 노선 일부 대야-익산 간을 장항선에 떼어주고 2022년 3월 6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단선單線이었다. 징검돌 같던 개정, 지경, 임피, 오산리를 딛고 우리는 세상을 건넜다. 철로鐵路는 뜯기고 역사는 허물어졌어도 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사람은 가도 판화로 남은 이야기는 어디선가 자꾸 찍힐 것이다. 이 작은 기록이 녹슬지 않을 것을 믿는다. 헤어지면 잊히는 게 필연이라지만 우리는 끝내 잊지 못할 것이다. 사라진 길이 도깨비처럼 우리를 추억으로 이끈다. 주소를 지번으로 적는다.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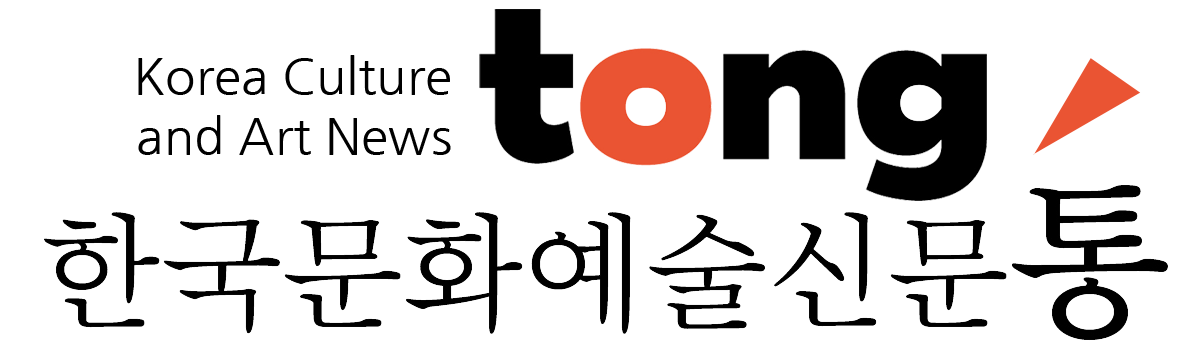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