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돌 같던 섬 섬 섬
안성덕의 길·3
본문

고군산군도
인간의 능력인가, 욕심인가. 꿈만 같은 일들이 곧잘 눈앞에 펼쳐지곤 한다. 일명 부산개성선이라 불리는 국도 77번, 부안에서 군산 구간 서해 앞바다에 방조제를 쌓았다. 남아도는 쌀을 생산하려, 지금도 차고 넘치는 공해물질을 쏟아낼 공장을 지으려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고 길을 냈다.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를 줄에 꿰듯 이어 붙였다. 옹기종기, 도란도란, 느릿느릿 이웃하던 섬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육지에 붙여 버렸다. 없던 길이 생기니 이심전심 주고받던 마음 길들이 사라졌다.

새만금 방조제길
부안에서 군산으로 새만금 방조제길을 간다. 방조제로 물길이 막히기 전, 물고기들은 자유로이 먼바다와 연안을 오갔을 것이다. 조개는 또 갯벌 속을 드나들며 수만 생을 이어 왔을 것이다. 그런 바다 생명들의 길을 막고, 빼앗아 오직 인간의 회색 길을 냈다. 이쪽 정권도 저쪽 정권도 똑같았다. 새만금 방조제, 오로지 정치적 목적이었던 것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있지도 않은 강에 다리를 놓는다는 정치가들, 표를 얻기 위해 수천만 년 들고나던 바다를 뚝딱뚝딱 막아 버렸다.

섬, 섬을 건너다
징검돌인 듯 섬, 섬, 섬이 있었다. 그 섬들 도란도란 귓속말 주고받으며 외롭지 않았을 터다. 징검돌은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했다. 콩 콩 어린아이 걸음 폭만큼 놓는다고 했던가? 딱 그만큼의 간격이던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섬들을 건너간다. 그저 앞 차 꽁무니만 따라간다. 군산 째보선창에서 연안여객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몰고 간다. 철새 떼가 하늘에 길을 낸다. 철새는 어디, 누구를 찾아 해마다 지도에도 없는 길 아닌 길을 오가는 걸까.

선유도
신선이 노닐었다는 선유도仙遊島, 나 아직 신혼 때 군산에서 시간 반 걸렸던 섬이다. 밤 열 시도 안 되어 전기가 끊기고 태초의 암흑에 갇히던 섬이었다. 그 밤 아내 손을 잡고 걸었던 명사십리 해변 파도 소리는 어디로 흘러가 차곡차곡 쌓여있을까? 머리 위로 깜빡이던 별빛은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을까? 낯선 발걸음 소리에 놀라 깜짝 숨어들던 칠게들은 이제 안심할까? 노닐던 신선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 빠앙 빵 부쩍 는 발걸음 소리에 그만 구름 속에 숨어드셨을까? 망주봉만 우뚝하다.

쉬 오는 길 쉬 가고
바다는 하루에 두 번 길을 바꾼다. 그 물길 따라 이 푸른 지구별에 생명들이 왔다던가? 그 물길 따라 바닷사람들 고기를 잡고 미역을 따고 조개를 캤다. 때론 그 물길 따라 먼바다에 나가 고래를 보았을 터다. 끝 간 데 없이 아득한 수평선 너머를 넘보았을 터다. 빠르게 들면 빠르게 나는 법, 자동차로 다리를 건너왔던 사람들 씽씽 재바르게 섬 아닌 섬을 빠져나간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가 휑하다. 천년만년 계속되던 물길이, 사람의 길이 이어 붙인 길 따라 짧아졌다. 콘크리트 길에는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다.

사라지는 길
배가 간다. 회색 콘크리트 제방과 나란히 인간이 끊어 버린 길을 내며 간다. 뒤로 하얗게 포말이 인다. 저 배의 흔적이다. 포말은 쉬이 부서진다. 사라진다. 언제 길이었냐는 듯이 금세 흔적도 없다. 우리네 인생길만 같다. 두 발로 꾹꾹 눌러 찍어 온, 내가 헤쳐온 길도 그렇다.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콘크리트 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그 또한 찰나다. 멀리 말도 쪽 하늘에 붉새가 붉게 난다.

밤이 길면 낮이 짧듯
밤이 길면 낮이 짧고 낮이 길면 밤이 짧은 자연의 일처럼, 사람도 길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 스스로 自에 그럴 然이다. 인류세는 인간 활동이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지질시대를 이르는 말이다. 인간이 제 발길을 위해 뭍 생명들의 길을 뺏어 버렸다. 호모 사피엔스는 불과 이십만 년 전에 출현했다.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 저 바닷속 물고기도 갯벌 속 조개도 하늘에 사람 인人 자를 쓰고 가는 철새도 모두 주인일 테다.
없는 길을 내면 있던 길 하나가 사라진다. 모든 것의 총화는 제로다. 우주의 법칙이겠다.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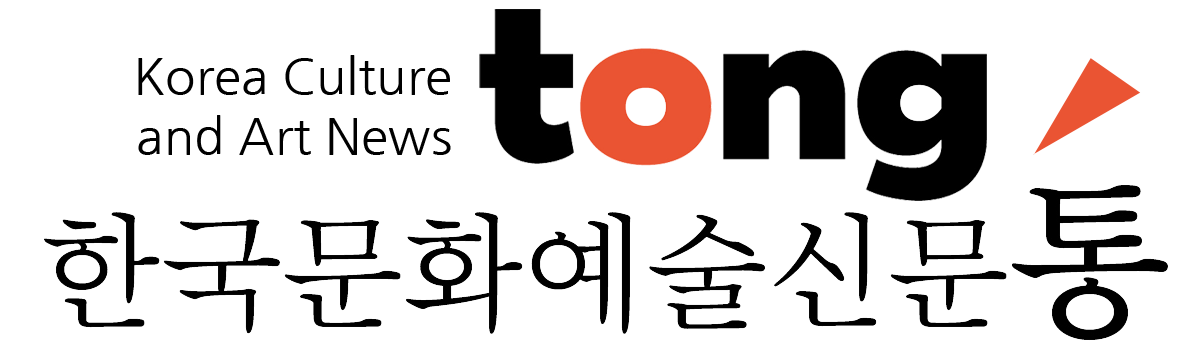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