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든 길
-안성덕의 길·9
본문
 김명관 고택 전경
김명관 고택 전경
앞에는 동진강(東津江), 뒤편엔 청하산을 둔 배산임수 택지다. 김명관(金命寬)이 17세 때 짓기 시작하여 10년 만인 정조 8년에 완성했다. 김명관의 조부가 의금부 관리였다고 한다. 중죄인을 다스리던 기관으로 사약, 귀양, 유배 같은 엄한 판결을 냈던 곳이 아니랴? 원한 맺힌 사람이 생겼을 수 있어, “불안해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살거라”, 조부가 태인 청석골과 이곳 산외 ‘동골’을 권했단다. 살펴본 날밤 꿈에 도깨비가 나와 “한 말이요, 두 말이요” 곡식을 되더란다. 김 씨를 왜 ‘도채비’라 하지 않던가. 바로 여기구나! 터를 잡았다던가.
 하마석
하마석
-하마석
대문간 하마석(下馬石), 당시에는 말 숫자로 세를 과시했다고 한다. 지금의 자동차겠다. 낙향한 처지라 해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을 터다. 한 시절 힘이 있었으니 여차저차 청을 넣는 사람들로 마구간이 좁았겠다. 천 리 먼 길이 대수랴. 닳고 닳아 문턱이 반들반들했겠다. 대문간을 들어서니 문간 마당에 또 안대문이 있다. 혹시 모를 침입자의 길을 잡아두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솟을대문
솟을대문
솟을대문 앞 노둣돌이 들락거리는 객들의 발길에 반들반들했을 시절도 있었으리라. 대문을 민다. 초인종인 듯 ‘삐그덕’ 거리며 끌리는 소리에 달려 나왔을 하인들의 종종걸음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통나무를 깎아 만든 문지방의 곡선은 눈 밝은 이 아니라면 놓칠 게 분명하다. 돌쩌귀며 거북 모양 빗장이 눈길을 붙든다. 백제 건축미 검이불루(儉而不陋)다. 대문 위 문살, 홍살문처럼 끝이 뾰족하다. 날카로운 문살에 찔릴세라 잡귀도 길이 막혔겠다.
 사랑채
사랑채
 사랑채 반담
사랑채 반담
-사랑채
반듯하다. 인근 무성서원(武城書院)의 강학당(講學堂)을 닮았다. 대개 사대부의 집은 돌로 단을 쌓고 집을 짓는데, 평지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고 한다. 음악의 3요소가 리듬, 멜로디, 하모니 아니던가. 건축 하나하나 리듬과 가락을 지녔으되 전체적인 조화 즉 하모니를 꼼꼼 챙긴 듯하다. 신라계 조형이 수직적이라면, 백제계 조형은 수평적이라 한다. 마당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드나들며 연을 잇고 줄을 대던 객들의 발자국 수없이 찍혔을 터다.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안채, 좌측이 시모 공간이고 우측이 며느리 공간이다. 며느리와 사랑채 젊은 주인이 남모르게 오갔을 통로를 ‘사랑의 미로’라 부른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 길은 지척도 까마득했을 것이다. 날마다, 밤마다 오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으나 눈치 살피며 발길 잡은 밤 많았으리라. 행여 눈 내리뜨고 안 보는 듯 사랑을 보았을까, 눈길 붙든 사랑채 까대기가 눈썹지붕이다.
 안채 가는 길
안채 가는 길
-안채와 안사랑채
마당에 놓은 디딤돌의 선이 아름답다. 곧바로 마당을 질러가지 않고 살짝궁 멋을 부렸다. 질러가면 몇 걸음 안 될 길을 에둘러 돌렸다. 급하게 들어와 가쁜 숨을 고르라는 듯하다. 급한 마음 잠시 다독이라는 말씀이겠다. 대청 좌우에 큰방과 작은방을 들이고 각각 부엌을 두었다. 부엌 동·서·남 측 벽에 빗살창을 두는 등 네 가지 문양의 문짝이 다채롭다. 달그락달그락 밥을 짓느라 분주했을 발걸음들이 눈에 선하다.
 안채
안채
 안채 마루
안채 마루
 측간
측간
-측간
자목련, 영산홍으로 가린 1칸 공간이다. 측간, 아니 꽃자리다. 조계산 선암사 해우소처럼 밑을 휑하니 비워두었다.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이 꽃향기에 지워지고 바람에 삭았겠다. 허리끈 풀고 쭈그려 앉아 한나절 세상도 잊고 나조차 잊고, 깜박 졸고 싶다. 똥도 꽃이었겠다. 멀수록 좋다는 측간 가는 길에 무르익은 봄 햇살이 가득 널려있다.
 사당
사당
-사당
안채 동북쪽에 있다. 죽은 이들 즉 조상들의 공간이다.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했다. 유일한 두리기둥이다. 주춧돌은 화강암을 사다리꼴로 깎았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을 사당 안팎이 떨어진 영산홍 꽃잎으로 흥건하다. 조상을 기리며 머리 숙여 드나들던 길, 대문조차 낮다. 조상은 또 자손들이 미덥지 못해 없는 길을 내며 모르게 드나들었을 터다.
 후문 호지집
후문 호지집
-호지집
딸린 노비들의 거주 공간이다. 당초에 안팎에 8채의 호지집을 두었다. 현 주차장 옆 해설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앞 호지집이다. 노비가 어찌 노동만 제공했겠는가, 근심 많고 경계 많은 주인을 보호했겠다. 옛 양반들은 가까운 곳에 하인을 두고 살았다. 숨 쉬고 먹고 자는 일 말고는 다 하인 몫이었을 터다. 맨 뒤쪽 호지집은 노비 중 가장 믿을 만 한 사람을 거주케 했단다. 행여 있을 도피 길을 위한 대비였겠다.
 연못
연못
-연못
주차장 옆, 蓮은 보이지 않으나 못을 파 연을 심은 뜻은 자명하다. 들어온 물이 그냥 흘러 나가버리면 안 되었기에, 들어온 재물이 쌓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기에 광을 짓듯 못을 파고 물길을 돌렸으리라. 연을 심었으리라. 만약의 화재도 대비했을 터다. 香遠益淸(향원익청),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는 주돈이(周敦頤) 애련설(愛蓮說)을 우물거려본다.
대대로 대를 잇는 것도 길이다. 후손들이 더욱 번성하여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 모시는 것도 길이다. 그러니 손이 끊기면 조상을 뵐 면목이 없는 것이다. 하여 양자를 들이거나 작은 이를 두고 드나들며 아들을 낳았지 않았겠는가. 불과 십대에 이 집을 지은 김명관은 조부의 당부대로 불안해 않고 살았는지 궁금하다. 능소화, 닭의장풀, 봉숭아, 옥잠화, 난초지초, 작약, 박태기꽃, 철쭉, 산수유……. 담장 밑에, 화단에, 꽃은 해마다 피고 지건만 집주인은 어느 길을 따라갔나, 간곳없다.
양반의 길을 생각한다. 권력자의 길을 생각한다. 부자의 길을 생각한다. 종을 부리고, 힘이 세고, 재물이 넉넉한 사람들은 행복하기만 했을까?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길 후회하지 않을까? 의금부에 근무한 조부 때문에 불안해 숨어지낸 김명관, 이 집은 곳곳에 담장이요 문이다. 담과 문은 막고 피하려는 것 아니었을까 싶다. 안 사랑채 마당에 이미 진 하양 영산홍 꽃잎이 눈처럼 수북했다.
 우물
우물
 담장
담장
 안채 부엌 창살
안채 부엌 창살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통'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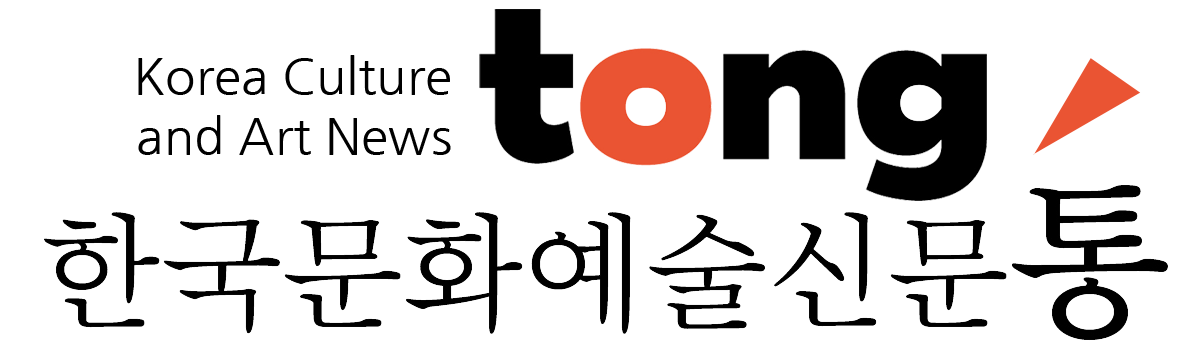




댓글목록1
이성필 기자님의 댓글
김명관 고택, 이 한가지 이야기가 이리도 재미 있을 수 있다니요.
한 생 한 시대가 갑니다.
어떻게 길을 가야하고 어떻게 길을 마칠려는지 생각이 잠시 깊어집니다.